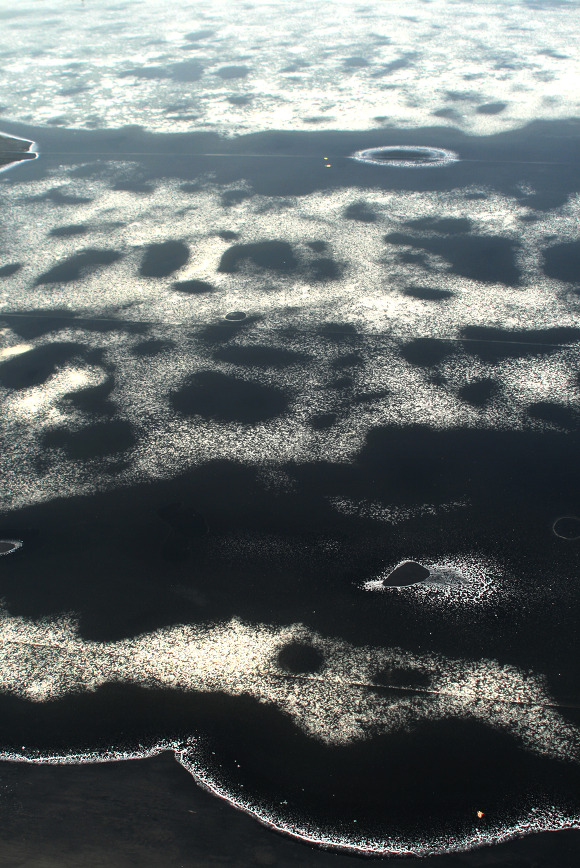하루는 모여 한 주가 되고, 한 주는 모여 한 달이 된다. 그 한 달들은 일 년이란 시간을 만들고 일 년은 십 년을, 십 년은 몇 배의 숫자로 자라나게 된다. 곰곰이 생각해보노라면 삶이란 건 도대체 무엇인가 싶은 거다. 핏덩이로 태어나 저 무수한 반복들을 보내고, 한낱 부지깽이 같은 몸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참으로 무의미하지 않나. 나는 태어나고싶어 태어났던가. 나는 죽고싶어 죽음에 이를 것인가. 삶에 내 의지 따위는 관철되지 않는다. 시작과 끝 그 어디에도 나의 뜻은 없다. 산다 죽는다, 죽는다 산다. 모르겠다, 삶은 무엇인가. 무엇이기에 날 이 지긋지긋한 우울에 내모는가. 결말이 정해진 삶 따위가 도대체 뭐기에.
삶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일지도 모른다. 세상을 알아갈수록 오히려 의미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게 되고 모호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어떤 것이 유의미 하고 어떤 것이 무의미한 것일까. 의미라고 명칭하는 것조차도 웃긴 일일지도 모른다는 자조섞인 웃음이 튀어나온다. 삶이란 것은 혼재다. 뒤죽박죽 모든 것이 뒤섞여 있다. 분별 없다. 생각이 정처 없이 떠다닌다. 나의 의미는 무엇일까 고심해본다. 그러다보면 염세적인 자아가 튀어나와 나를 장악한다.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자문하게 돼버린다. 아, 나는 뭘까
부질없다. 불확실 속의 일말의 가능성에 희망을 두고 매일 고통받는 것은 모두 다 부질없다. 스스로의 깨달음과 전혀 관계된 바 없다는 듯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욕심에 고통스럽다. 성찰과 욕구는 극단에 치우친 거 같이 매번 양상을 다르게 쌓아간다. 어느 날은 모든 것이 의미 없어 포기하고만 싶어 지고, 어느 날은 한 줌의 희망을 찾아 끝없이 전진한다. 대립과 진척에 무뎌져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여상한 나날들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끝 없는 반복에 무기력하게 침전했다.
소망하고 소유하지 못한 것에 미련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일까, 인간이란 간사한 존재여서 자신에게 예속되지 않았을 때는 그 무엇보다 갈망하고 원하면서 나의 것으로 전락하는 순간 뒤도 돌아 보지 않고 미련을 놔 버린다. 완벽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 지는 것인가 종속되어 지는 것인가? 경험은 나를 증명하고 성장시킨다 결핍에 직면하는 일이 많아질 수록 과연 익숙해진 미련에 해방감을 느낄 수 있을까? 사실 나는, 허구일지라도 완벽이라는 기준점에 항상 부합하고 싶다. 그 속에서 안정감을 매 순간 느끼고 싶다. 세상이 원하는대로 돌아간다는 치기 어린 자만심과 만족감을 느끼고 불안에 종지부를 찍고 싶다.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해 떼를 쓰는 어린아이들과 사실 나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